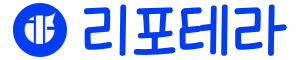국민들 모두가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 드라마

과거, 대한민국은 TV 드라마의 황금기를 맞이한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 드라마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국민적 관심사와 문화적 현상의 중심에 있었다.
스마트폰이나 PC가 일상의 일부가 되기 전, TV는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오락 수단이었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방영되던 인기 드라마는 온 가족이 모여 시청하는 것이 당연한 풍경이었으며, 그 인기는 길거리가 텅 비는 현상까지 발생시키곤 했다.
그만큼 그 시절 TV 속 드라마의 인기는 굉장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들은 무엇일까.
‘첫사랑’의 불멸의 기록

1996년 9월 7일, 대한민국의 TV 역사에 길이 남을 드라마 하나가 KBS2를 통해 처음 방송되었다. 드라마 ‘첫사랑’은 당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무려 65.8%라는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는 기록으로, 요즘 시청률 10%만 넘어도 대박으로 여겨지는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전설적인 수치다.
이 드라마는 최수종, 배용준, 이승연, 최지우, 차태현, 박상원 등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해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 각각의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은 이들은, “첫사랑”을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 현상으로 만들었다.
66부작에 걸쳐 방영된 이 드라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여운을 남기며,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첫사랑의 달콤하면서도 아련한 추억을 다시금 되새기게 했다.
모래시계, 시대를 초월한 명작 드라마

1995년 1월 9일, 대한민국의 거실을 사로잡은 드라마가 있었다. 바로 SBS에서 방송된 “모래시계”다. 당시 64.5%라는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하며,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 집에 일찍 귀가하던 시절, ‘귀가시계’라는 별칭으로까지 불렸다.
드라마 모래시계는, 단 24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이야기를 담아내며 시청자들을 매료시켰다. “나 지금 떨고있냐?” 는 모래시계 속 명대사로 손꼽히며, 수많은 패러디를 낳은 이 대사는 단순한 문장을 넘어서, 그 시대의 분위기와 감정을 담아내며 전설적인 존재가 되기도 했다.

또한, 고현정의 보디가드 역할을 맡아 말없이 그녀를 지키던 이정재의 인상적인 연기는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아있다.
한편, “모래시계”의 촬영지 중 하나였던 정동진은 드라마 방영 이후 큰 변화를 맞이했다. 이제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어,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그 자체로도 매력적인 장소로 자리 잡았다.
젊은이의 양지,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은 기억

1995년 5월 6일, KBS2를 통해 첫 방송된 “젊은이의 양지”는 1980년대 광산촌을 배경으로 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젊은이들의 열정, 사랑, 그리고 꿈을 담아낸 드라마이다.
62.7%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당시 사회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 드라마는 조소혜 작가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으로, 그녀가 이전에 집필한 “첫사랑”의 성공에 이어 또 하나의 명작을 선보였다.
“젊은이의 양지”는 배용준, 이종원, 하희라, 허준호, 전도연, 박상민 등 당대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출연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배용준에게 있어 이 드라마는 “겨울연가”를 통한 일본에서의 폭발적인 인기에 앞서, 그가 본격적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작품이 되었다. 또한, 차태현에게 이 드라마는 그의 데뷔작으로, 이후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배우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젊은이의 양지”는 단순히 광산촌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넘어서, 당시 사회의 다양한 모습과 젊은이들이 겪는 어려움, 사랑, 우정, 그리고 꿈을 추구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이 드라마는 1980년대 대한민국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젊은 세대의 희망과 좌절을 현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과 공감을 안겨주었다.
이 밖에도 그 시절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작품들이 많다. 과거 우리는 단순히 드라마의 이야기만을 공유했던 것이 아니라, 웃음과 눈물, 그리고 가족이라는 연결고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을 함께했다.
그 시절이 그리운 것은 아마도 그때 우리가 느꼈던 연결감과 소속감, 그리고 순수한 즐거움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